데미안
Fig.1 데미안, 민음사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아는 만큼만 보였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다. 그냥 읽어도 은유와 상징이 많아 독자마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데미안 독후감을 검색해보아도 영지주의, 분석심리학을 바탕으로 분석한 리뷰가 많았다. 너무 늦게 읽었나, 너무 일찍 읽었나, 두 생각이 동시에 드는 어려운 책이었다.
이 책의 독후감을 쓰기에는, 애석하게도 공대생인 본인으로서는, 제한적인 시야만으로 보았다. 기껏해봐야 최근 알게 된 스토아 학파와 자유주의적인 시선에서 보는 정도였다. 이 리뷰에서는 그런 시야로 본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고자 한다.
스토아 철학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스토아 철학의 주요 사상 중 데미안에서 느낀 것은 아래와 같다.
-
운명을 피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사랑하며 받아들인다.
-
매 순간 현재에 집중한다.
-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즉 외부와 자아의 경계를, 자유의 범위를 깨닫고 판단해야 한다.
-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며,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보편 이성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선을 추구한다.
민음사판 작품 해설에서도 나오듯이, 데미안Demian과 그리스 철학의 다이몬Daimon과의 유사성을 느낄 수 있었다. 데미안이 자아의 경계를 의식하고, 내면의 보편 이성에 집중하고, 운명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그리스 철학에서 배웠던 부분을 생각할 수 있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는 무언가를 보고 미워하는 거지. 우리 자신 속에 있지 않은 것, 그건 우리를 자극하지 않아.
피스토리우스가 인식에 대해 말한 것 또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외부 대상과 표상 간 관계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부의 사물은 그대로 있으나 이를 우리의 판단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명상록 수업 VI챕터의 이미지phantasia, 판단hypolepsis, 동의sunkatatheseis의 관계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그리스 철학 또한 이 작품에서는 기존의 규범이며, 검토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모두 받아들이는 데미안, “누군가를 죽이거나 어떤 어마어마하게 불결한 짓”을 부정하지 않는 피스토리우스는 인간 내면의 보편 이성으로부터의 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자유론
J. S. 밀의 자유론의 내용 중, 데미안에서 느낀 것과 비슷한 내용을 꼽자면 아래 두 내용이 있겠다.
1장 서론
... "the tyranny of the majority" is now generally included among the evils against which society requires to be on its guard. ... since, though not usually upheld by such extreme penalties, it leaves fewer means of escape, penetrating much more deeply into the details of life, and enslaving the soul itself.
... ‘다수의 압제’는 지금 사회가 경계해야 할 악으로 널리 꼽히고 있다. ... 사회는 보통 정치적 탄압과 같은 극단적 처벌을 통해 지탱되지는 않지만, 도피 수단을 거의 남기지 않고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훨씬 더 깊이 침투해 들어가 영혼 그 자체를 노예화하기 때문이다.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관하여
... his opinion may be false, he ought to be moved by the consideration that however true it may be, if it is not fully, frequently, and fearlessly discussed, it will be held as a dead dogma, not a living truth.
... 자기 의견이 아무리 참이라 해도 그것이 충분히, 자주, 기탄없이 토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 있는 진리가 아니라 죽은 교조로 남게 되리라는 것이다.
데미안의 1장에서부터 계속 언급되는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구분하는 규범은 기존의 사회적 규범이고, 이런 전통적인 규범에서 자유론의 ‘다수의 압제’가 떠올랐다. 또한, 데미안과 피스토리우스가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은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서 강조된 ‘비판적 수용’을 떠오르게 한다.
잘 모르겠는 부분
하지만 작품 후반부에서 에바 부인에 대해 다루는 부분이나 전쟁에 대해 다루는 부분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에바 부인에 대해서는, 내면의 이성을 데미안으로 잘 표현하던 것 같은데, 굳이 에바 부인이라는 상위의 존재를 표현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어쩌면 “철학의 위안”에서 철학의 여신이 절대선을 찬미하는 것처럼, 데미안과 에바 부인도 비슷한 관계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말의 전개에서도 의문이 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결말의 의미는 데미안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다이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싱클레어가 폭격에 맞아 병원에 실려가는 것이 어떤 깨달음의 계기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전개를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지주의적 해석, 분석심리학적 해석, 기호학적 해석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책으로 알고 있다. 피스토리우스나 크나우어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 전쟁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볼 이유는 있는 책인 것 같다.
결론
정리하면, 철학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 책이며, 개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생각이 든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책이었고, 아는 만큼만 보인 책이다보니 철학 관련 책을 더 읽고 나서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이다.
참고문헌
H. Hesse, 전영애, Transl., 데미안, 민음사,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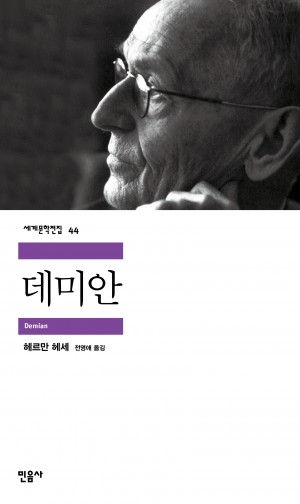
Leave a comment